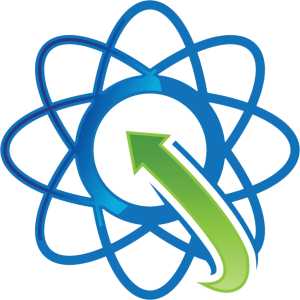미륵정토사 &
초무한참나선원
미륵정토종 안내

2. 세계 각 종교 탐방
5) 이슬람교(Islam)
: 7세기 초 아라비아의 예언자 마호메트(이슬람어로 무하마드)가 완성시킨 종교. 그리스도교·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이다.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신 알라의 가르침이 대천사(大天使)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호메트에게 계시되었으며, 유대교·그리스도교 등 유대계의 여러 종교를 완성시킨 유일신 종교임을 자처한다.
유럽에서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마호메트교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위구르족[回紇族]을 통하여 전래되었으므로 회회교(回回敎) 또는 청진교(淸眞敎)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슬람교 또는 회교(回敎)로 불린다.
【성 립】 성지(聖地)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 중부, 홍해(紅海) 연안에서 약 80 km 지점의 불모지 골짜기에 위치하는 도시로, 인도양에서 지중해안에 이르는 대상로(隊商路)의 요지인 동시에 카바 신전과 북동쪽 구릉지대는 옛날부터 유대교·그리스도교의 신성한 영장(靈場)으로 되어 있어 매년 많은 대상과 순례자(巡禮者)들이 찾아들었다.
메카의 지배계급은 5세기 말경, 부근 황야에서 온 코레이시족(族)이었으며 마호메트는 그 중의 하심가(Hashim 家) 출신이다. 마호메트는 아버지가 죽은 후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도 얼마 후에 죽었으므로 어린 마호메트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졌고, 그 후 숙부의 손에 양육되었다. 당시 아라비아 각지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전해져 그 신도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 메카에도 그 영향이 미쳐 신은 유일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그들을 ‘하니프(Hanif)’라고 불렀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여전히 다신교(多神敎) 신당에 빠져, 돌·천체·샘·수목 등을 숭배하였다. 하니프들은 이에 반대하여 세계의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때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되고, 유일신은 곧 창조주이며 인간에 대하여 선의를 갖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마호메트가 자신은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모든 아라비아 백성에게 전도할 사명을 띤 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40대에 들어서였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다분히 하니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마호메트가 메카 근교의 힐라산(山) 동굴에서 최초로 하늘의 계시를 받은 후 맨 처음 그의 아내 하디자가 입신(入信)하였는데, 그 후 그녀는 메카의 박해시대에는 자주 남편의 힘이 되어 주었다.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선교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40명, 10년 만에 겨우 100명의 신도밖에 얻지 못하였고 게다가 메카의 집권자인 코레이시족의 박해가 날로 심해졌으므로, 이를 피하여 622년 9월 메카 북방 약 400 km 떨어져 있는 메디나로 갔다. 신도들도 이때를 전후하여 메디나로 피난, 그곳 협력자들(안사르)의 집에 수용되었다.
이 메디나행(行)을 이슬람에서는 ‘헤지라[聖遷]’라고 하는데, 이 해를 이슬람력(曆)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아라비아에서는 어떤 명문 인사가 다른 유럽 부족의 보호를 요청하여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헤지라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끔 볼 수 있는 풍습이다. 마호메트의 운명과 이슬람의 장래는 이 헤지라를 통하여 일변하였다.
메카에서 이주한 교도(무하지룬)와 메디나의 협력자들은 힘을 합쳐 교단(敎團:움마)을 조직하였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시초인데, 후에 점차 강화되어 이슬람교단은 국가로까지 발전했다. 그 후 마호메트는 교단을 이끌고 여러 차례 메카군과 싸워 630년 1월에는 마침내 메카를 정복하고, 카바 신전(神殿)을 알라의 신전으로 바꾸어놓았다. 얼마 후 아라비아인의 태반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광대한 아라비아 지역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된 것은 실로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
그의 이상은 종래의 부족단위의 사회를 하나의 이슬람 교단으로 바꾸어,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 전체 교도를 한 형제로 삼는 평화스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632년 6월 메디나의 자택에서 병사하였다.
【신 앙】 ⑴ 알라와 《코란(쿠란)》: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는 다신교 시대부터 메카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마호메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고 오직 알라만을 유일신으로 내세웠다.
알라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이와 동등하거나 비교될 존재는 없다. 모든 피창조물과는 엄격한 거리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경동맥(頸動脈)보다도 더욱 가까이 있다. 알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지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관대하고 자애에 넘쳐 잘 용서하고, 잘 들어 주고, 잘 보아 준다. 알라는 진리이며 빛이며 “동도 서도 알라의 것, 어느 쪽을 향해도 알라의 얼굴은 거기에 계신다. 골고루 존재하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코란 2:11)고 한다. 알라의 계시를 모은 것을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호메트가 말한 내용으로서, 그가 죽은 뒤 신도들이 수집·정리한 것이다.
현재의 《코란》은 650년경,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의 명을 받들어 만들어진 표준본이다. 이 경전은 이슬람의 교의(敎義)·제도, 마호메트의 생애와 사상을 알 수 있는 근본 문헌이며, 무슬림들은 이것을 독송할 때마다 법열(法悅)의 경지에 빠져 감격의 눈물을 흘릴 만큼 힘과 미를 갖춘 것이지만 그 진가는 아랍어로 된 원전에 따르지 않고는 좀체로 이해하기 힘들다.
《코란》은 마호메트에게 계시된 바를 해설이 없이 모은 것이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후세 학자들이 쓴 많은 주석서(注釋書)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의 법학(法學)·신학(神學)의 최고 근원은 역시 《코란》에 있다.
⑵ 이슬람의 근본신조: 이 가르침의 정식 명칭은 ‘알 알이슬람’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유일 절대의 신, 알라의 가르침에 몸을 맡긴다”는 말로서 즉 ‘귀의(歸依)’를 뜻한다. 그 가르침은 모두 명확한 아랍어로 계시되었고 마호메트도 이것을 아랍어로 전달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신조이며, 후에 “마호메트는 알라의 사자(라수르)이니라”가 추가되었다.
이 성구(聖句:카리마)를 외는 일은 신도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되어 있다.
알라의 가르침을 모은 《코란》에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믿음이란, 그대들의 얼굴을 동으로 또는 서로 돌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알라와, 최후의 날(최후 심판의 날)과, 천사들과, 여러 경전(經典)과,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을 믿는 것을 ‘이만’이라고 한다. 또 오로지 알라만을 믿고 그 외에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예배·희사(喜捨)·재계(齋戒) 등의 근행(勤行)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만이 알라에 귀의하는 길인데, 이것을 ‘이슬람’이라고 칭한다. ‘이만’을 지닌 사람을 ‘무민’, 이슬람에 입교한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므로, 이것들 모두가 이슬람교 신자의 호칭이다.
⑶ 이슬람 신앙의 요소:이슬람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의 셋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지(知)’인데, 이것은 알라의 계시를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언(言)’인데, 마음으로 알고 또한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일이다. 셋째는 ‘행(行)’인데, 이슬람교도로서의 의무(즉 5주 등)를 열심히 실행하는 일이다.
⑷ 오주(五柱):무슬림에게는 실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것을 오주(아르칸 알이슬람:Pillars of Islam)라 하며, 이들 의무를 다함으로써 알라에게 봉사하는 일을 ‘이바다트(奉化 또는 勤行)’라고 한다. 《코란》에서는 희사와 단식(斷食)을 중요한 봉사로 들고 있으나, 후세에 이르러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① 증언 또는 고백(샤하다):“나는 알라 이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또 나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사자임을 증명합니다”를 입으로 왼다. 신도는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증언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
② 예배(살라트):일정한 시각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행하는 예배를 말하며, 개인적으로 수시로 행하는 기도는 ‘두아’라고 부른다. 예배는 하루에 다섯 번을 일출·정오·하오·일몰·심야에 하며, 특히 금요일 정오에는 모스크에서 집단예배를 행한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하고 행한다.
③ 희사(자카트) 또는 천과(天課):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며, 비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기반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불가결한 무슬림의 의무중의 하나이다.
④ 단식(샤움):성년인 무슬림은 매년 라마단 월간(月間:제9월) 주간(晝間)에 음식·흡연·향료·성교를 금하고, 과격한 말을 삼가며 가능한 한 《코란》을 독송한다. 단 음식은 흰실과 검은실의 구별이 안 될 만큼 어두워진 야간에는 허용된다. 라마단 월이 끝난 다음 새 달이 하늘에 떠오르면 단식완료의 축제가 시작되는데, 화려한 의상을 입은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서로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⑤ 순례(하주):모든 무슬림은 매년 하주의 달(이슬람력 제12월)에 카바 신전 부근 또는 메카 북동쪽 교외에서 열리는 대제(大祭)에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참가할 의무가 있다. 능력이 없는 자는 하주를 못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해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현재도 매년 약 20만 명에 달하는 신도가 하주에 참가하고 있다. 메카 다음가는 성지는 메디나에 있는 마호메트 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예루살렘의 여러 성적(聖蹟) 등이 있으며, 또 시아파(派)의 무슬림은 알리의 묘(廟)가 있는 나자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의 묘가 있는 카르발라, 이란 동부의 마슈하드 등을 순례하는 사람이 많다.
⑸ 교도의 일상생활:이슬람 세계는 많은 이민족을 포함하고 있어 그들은 각각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사회의 요소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무슬림은 하나의 형으로 통일되어 공통의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샤리아(이슬람법)로써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며,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 Hadith》(마호메트와 그의 추종자들의 전설에 관한 서적에 사용되는 명칭)에 입각하여 제정된 이슬람법이다.
무릇, 무슬림된 자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 샤리아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된다. 인간의 행위는 5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반드시 행해야 하며 이것을 하면 보상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② 가상(可賞)할 행위로, 이것을 행하면 보상받으나 행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는 것,
③ 허용된 행위로, 이것은 행하여도 보상도 없고 벌도 받지 않는 것,
④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것은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행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⑤ 금지된 것으로 이것을 행하면 알라의 벌을 받는 것이다(하람, Haram:이슬람법 용어).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거나 음주하거나 하는 일은 하람 ⑤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람에 대하여는 시대와 지방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약간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중세 이래 모스크는 교도의 생활중심이 되어 왔으나 11세기 투르크가 각지에서 지배권을 장악한 뒤부터는 오로지 예배장소로만 되고, 그 밖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샤리아에 따라 규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이슬람교도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이단파와 수피즘】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란》이지만 마호메트가 죽은 뒤에는 그것만으로는 교의상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그러한 때에는 ‘수나(마호메트의 언행)’로써 보완되었다.
그리고 이 수나를 중요시하여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수니파(派)라고 하여 이것이 이슬람교의 정통파로 지목되는데, 이슬람교도의 대부분이 수니파에 속한다. 아라비아의 원시 이슬람은 다른 여러 민족을 정복함에 따라 많은 종교와 사상에 부딪쳐,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몇 개의 이단적 유파(流派)가 생겨났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뱃사람이나 장사꾼을 그 주축으로 하는 하리지파(派)가 그 최초의 것인데, 7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오만·동아프리카·북아프리카 등지에 약간 잔존할 뿐이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혈통은 딸 파티마와 제4대 칼리프인 그의 조카 알리와의 사이에 태어난 하산과 후세인의 두 아들 계통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 특히 후세인의 계열을 교주로 추대하는 시아파(派)는 후에 이란의 종교사상을 받아들여 최초의 이단적 종파가 되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 교리는 70개로 분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고 하는데, 확실히 시아파는 많은 지파(支派)로 분열되어 극단파를 낳았는데, 개중에는 이미 이슬람교로 간주할 수 없게 된 것까지도 있다. 이같이 이단 종파는 상당수가 있으나, 신도수는 전체의 10 %에도 못 미친다.
이슬람의 신비주의라고 일컫는 수피즘(또는 수피파)은 원래 원시 이슬람 사회 안에서 금욕·고행을 주의로 삼는 일파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그리스 사상과 유대교·그리스도교·불교 등의 신비주의까지 받아들여 사상계의 일대조류로 발전하였다. 이 수피즘은 이슬람 신앙의 형식주의, 행위의 표면만을 보고 사람을 심판하는 이슬람법에 대한 반동에서 발전한 것으로, 이슬람교가 세계적 대종교로 발전한 것은 실은 이 수피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반면 이슬람 사상 속에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배격하려는 자도 있다.
【발 전】 ⑴ 이슬람권의 확대:마호메트의 사후, 교단은 신도의 장로 중에서 교통(敎統)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출하였다. 그 후 아라비아반도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633~664년 시리아·이라크·북부 메소포타미아·아르메니아·이란·이집트 등을 정복하고 여러 곳에 기지도시(基地都市)를 건설하였다.
그 후에도 정복사업은 계속되어 우마이야왕조 시대에는 서쪽은 북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까지, 다시 711년부터는 이베리아(에스파냐) 반도에 침입하였고, 동쪽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그 지배력이 미쳤다.
피레네산맥을 넘어 프랑스의 중추부까지 진출한 군은 732년 푸아티에 북방의 싸움에서 패퇴하였으나, 동방에서는 751년 여름 탈라스강(江)의 싸움에서 당군(唐軍)을 대파하고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아바스 왕조 초기 100년간은 칼리프 정권의 전성기였는데, 그 후 이베리아는 우마이야가(家) 일파에 의하여 독립하고, 이어서 모로코·튀니스·중앙아시아·이란 동부·이집트 등에도 독립정권이 출현하여 칼리프의 직할지는 점차 축소되었다.
10세기에 들어서자 921년 이후 볼가강 중류의 불가르족(族)이, 이어서 960년 이래 톈산남북로[天山南北路]의 투르크족(族)이 다같이 대량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아랍족, 이어서 이란인(人)이 중심이었던 이슬람 세계는 이 무렵부터 투르크의 패권 밑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생겨, 10세기 말부터는 투르크계 가즈니왕조의 마호무드왕은 자주 인도에 침입하여 이 지방의 이슬람화가 확고한 기반에 놓였다.
한편, 동아프리카에는 740년 무렵부터 이슬람교가 퍼지기 시작하여 1010년경에는 사하라 사막을 넘어 나이저 강변의 서(西) 수단 지방에 있는 흑인 왕국에까지 이슬람의 세력이 미쳤다. 1071년 아르메니아의 만지케르트 싸움에서 셀주크 투르크군은 비잔틴군을 격파하였다. 이 때부터 서아시아의 이슬람화·투르크화가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11세기 말~13세기 말의 거의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운동이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그리스도교도의 역정복(逆征服)이 진행되어 1493년에는 무어인(人)의 최후 거점인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마침내 이슬람은 북아프리카로 후퇴하였다. 이와는 달리 셀주크왕조와 교체된 오스만왕조는 발칸반도로 진출하여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공략, 비잔틴 제국(帝國)을 멸망시켰다. 또 인도에 세력을 부식한 이슬람교도는 이곳을 기지로 하여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방면에 선교를 하여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는 15~16세기에 광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⑵ 분포 현황:현재의 이슬람 교도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계 인구의 약 25 %인 12억 내외로 알려져 있다.
지역적으로는 북아프리카·아라비아반도와 이란에 이르는 이른바 중동지역과, 동부 러시아, 투르크·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서부·중국·인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타 한국·일본 등 세계 곳곳으로 선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도 오랜 이슬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백 만의 무슬림들이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서의 이슬람 문화·역사·종교학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도 오래되었고 수준도 높다.
【한국의 이슬람교】 불교와 그리스도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에게 생소한 이슬람교가 그 두꺼운 벽을 뚫고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55년이다. 이슬람교의 전파는 1955년 9월, 6·25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터키 부대의 압둘 라흐만 종군 이맘(성직자를 가리킴)과 주베르코취 종군 이맘의 지도와 협조 아래 김진규(金振圭)와 윤두영(尹斗榮)이 선교를 시작하였다.
한국 이슬람교 협회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 김진규, 부회장 겸 사무국장 윤두영과 신도 70여 명으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시작되었다. 초창기 10여 년 간에 선교·운영의 난관을 극복하고 65년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로 재발족, 67년 3월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로 인가되어 신도 7,500명의 교세를 갖게 되었다.
76년 5월 현재의 용산구 한남동에 중앙성원(中央聖院)을 건립하고(사우디아라비아 기타 6개국의 원조로), 80년 항도 부산에 제2성원, 81년 경기 광주에 제3성원, 86년에는 안양시에 제4성원과 전주시에 제5성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해외교포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인도네시아에 지회가 설립되고 국내의 신도수 약 3만 4000명의 교세를 가지게 되었다.
80년 5월 대통령 최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칼리드 국왕과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한국 이슬람대학 설립 공사비 일체의 제공을 확약받았으며, 경기 용인에 13만 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한국의 이슬람교는 70년대의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두드러지게 교세 확장을 보였는데, 매년 중동 각지에서 무슬림이 되어 귀국한 1,700여 명의 기능근로자 신도들을 핵으로 삼아 신도 배가운동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슬람교는 한국인의 유교적 전통이나, 현대의 남녀동등 사상까지의 차이점 일부일처주의의 헌법조항에 배치되는 일부다처주의 등을 비롯하여 예배의식의 용어 및 교리의 토착화 등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이슬람교 경전 코란(Koran/Quran)
이슬람교의 경전(經典).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619년경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부터 632년 죽을 때까지의 계시·설교를 집대성한 것이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40세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근교의 히라산(山) 동굴에서 천사(天使)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코란》이란 아랍어로 ‘읽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계시받은 마호메트의 말은 초기의 사도(使徒)들에 의해 기억되어 낙타의 골편(骨片)이나 야자의 엽피(葉皮), 암석의 파편 등에 불완전한 문자로 기록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승이 다양해져 그의 집성·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코란》의 결집(結集)이 이루어졌는데, 초대 칼리프 아부 바크루가 시도하여 본격적인 결집은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이 646년에 완성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란》은 당시 정리된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코란의 구성】 《코란》의 용어는 아랍어의 메카 방언이었으나 이것이 후에 고전 아랍어로 널리 쓰이게 되어 현행 아랍어 문어체의 기초가 되었다. 문체는 ‘사주아’라는 일종의 운(韻)을 단 산문체로 되어 있어 독송할 때 그 리듬감이 매력을 느끼게 한다. 현행 《코란》은 6,342아야[句節]와 114수라[章]로 되어 있으며, 각 수라에는 ‘암소’, ‘이므란 일가(一家)’, ‘여자’ 등과 같이 그 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제가 붙어 있다.
제1수라의 개경장(開經章)은 7아야로 된 짧은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주기도문(主祈禱文)’에 해당하며, 이슬람교도는 자주 이것을 독송해야 한다. 다른 수라는 대개 아야의 수가 많은 것에서 적은 것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서 최종 장에 이르러서는 아야의 수가 아주 적어진다. 예를 들면, 제2수라는 286아야, 제3수라는 200아야인데, 제113수라는 5아야, 제114수라는 6아야로 되어 있다. 모든 수라에는 ‘메디나 계시(啓示)’ 또는 ‘메카 계시’라는 표시가 있는데, 메카 시대의 계시는 극히 신앙적인 짧은 것이기 때문에 현행 《코란》에서는 대개 후반에 집성되어 있고, 후대의 메디나 계시는 대부분 전반에 편입되어 있다.
【코란과 주해서】 《코란》에는 아랍의 고속(古俗)과 유대교·그리스도교의 전승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또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역사적 사건에 관한 부분도 적지 않으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코란》에 주해(탑시르)를 첨기(添記)할 필요성이 생겨 그것이 이슬람 신학자들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었다.
※ 상기의 내용은 두산세계대백과 사전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7세기 초 아라비아의 예언자 마호메트(이슬람어로 무하마드)가 완성시킨 종교. 그리스도교·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이다.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신 알라의 가르침이 대천사(大天使)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호메트에게 계시되었으며, 유대교·그리스도교 등 유대계의 여러 종교를 완성시킨 유일신 종교임을 자처한다.
유럽에서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마호메트교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위구르족[回紇族]을 통하여 전래되었으므로 회회교(回回敎) 또는 청진교(淸眞敎)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슬람교 또는 회교(回敎)로 불린다.
【성 립】 성지(聖地)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 중부, 홍해(紅海) 연안에서 약 80 km 지점의 불모지 골짜기에 위치하는 도시로, 인도양에서 지중해안에 이르는 대상로(隊商路)의 요지인 동시에 카바 신전과 북동쪽 구릉지대는 옛날부터 유대교·그리스도교의 신성한 영장(靈場)으로 되어 있어 매년 많은 대상과 순례자(巡禮者)들이 찾아들었다.
메카의 지배계급은 5세기 말경, 부근 황야에서 온 코레이시족(族)이었으며 마호메트는 그 중의 하심가(Hashim 家) 출신이다. 마호메트는 아버지가 죽은 후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도 얼마 후에 죽었으므로 어린 마호메트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졌고, 그 후 숙부의 손에 양육되었다. 당시 아라비아 각지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전해져 그 신도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 메카에도 그 영향이 미쳐 신은 유일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그들을 ‘하니프(Hanif)’라고 불렀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여전히 다신교(多神敎) 신당에 빠져, 돌·천체·샘·수목 등을 숭배하였다. 하니프들은 이에 반대하여 세계의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때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되고, 유일신은 곧 창조주이며 인간에 대하여 선의를 갖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마호메트가 자신은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모든 아라비아 백성에게 전도할 사명을 띤 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40대에 들어서였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다분히 하니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마호메트가 메카 근교의 힐라산(山) 동굴에서 최초로 하늘의 계시를 받은 후 맨 처음 그의 아내 하디자가 입신(入信)하였는데, 그 후 그녀는 메카의 박해시대에는 자주 남편의 힘이 되어 주었다.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선교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40명, 10년 만에 겨우 100명의 신도밖에 얻지 못하였고 게다가 메카의 집권자인 코레이시족의 박해가 날로 심해졌으므로, 이를 피하여 622년 9월 메카 북방 약 400 km 떨어져 있는 메디나로 갔다. 신도들도 이때를 전후하여 메디나로 피난, 그곳 협력자들(안사르)의 집에 수용되었다.
이 메디나행(行)을 이슬람에서는 ‘헤지라[聖遷]’라고 하는데, 이 해를 이슬람력(曆)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아라비아에서는 어떤 명문 인사가 다른 유럽 부족의 보호를 요청하여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헤지라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끔 볼 수 있는 풍습이다. 마호메트의 운명과 이슬람의 장래는 이 헤지라를 통하여 일변하였다.
메카에서 이주한 교도(무하지룬)와 메디나의 협력자들은 힘을 합쳐 교단(敎團:움마)을 조직하였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시초인데, 후에 점차 강화되어 이슬람교단은 국가로까지 발전했다. 그 후 마호메트는 교단을 이끌고 여러 차례 메카군과 싸워 630년 1월에는 마침내 메카를 정복하고, 카바 신전(神殿)을 알라의 신전으로 바꾸어놓았다. 얼마 후 아라비아인의 태반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광대한 아라비아 지역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된 것은 실로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
그의 이상은 종래의 부족단위의 사회를 하나의 이슬람 교단으로 바꾸어,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 전체 교도를 한 형제로 삼는 평화스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632년 6월 메디나의 자택에서 병사하였다.
【신 앙】 ⑴ 알라와 《코란(쿠란)》: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는 다신교 시대부터 메카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마호메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고 오직 알라만을 유일신으로 내세웠다.
알라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이와 동등하거나 비교될 존재는 없다. 모든 피창조물과는 엄격한 거리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경동맥(頸動脈)보다도 더욱 가까이 있다. 알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지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관대하고 자애에 넘쳐 잘 용서하고, 잘 들어 주고, 잘 보아 준다. 알라는 진리이며 빛이며 “동도 서도 알라의 것, 어느 쪽을 향해도 알라의 얼굴은 거기에 계신다. 골고루 존재하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코란 2:11)고 한다. 알라의 계시를 모은 것을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호메트가 말한 내용으로서, 그가 죽은 뒤 신도들이 수집·정리한 것이다.
현재의 《코란》은 650년경,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의 명을 받들어 만들어진 표준본이다. 이 경전은 이슬람의 교의(敎義)·제도, 마호메트의 생애와 사상을 알 수 있는 근본 문헌이며, 무슬림들은 이것을 독송할 때마다 법열(法悅)의 경지에 빠져 감격의 눈물을 흘릴 만큼 힘과 미를 갖춘 것이지만 그 진가는 아랍어로 된 원전에 따르지 않고는 좀체로 이해하기 힘들다.
《코란》은 마호메트에게 계시된 바를 해설이 없이 모은 것이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후세 학자들이 쓴 많은 주석서(注釋書)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의 법학(法學)·신학(神學)의 최고 근원은 역시 《코란》에 있다.
⑵ 이슬람의 근본신조: 이 가르침의 정식 명칭은 ‘알 알이슬람’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유일 절대의 신, 알라의 가르침에 몸을 맡긴다”는 말로서 즉 ‘귀의(歸依)’를 뜻한다. 그 가르침은 모두 명확한 아랍어로 계시되었고 마호메트도 이것을 아랍어로 전달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신조이며, 후에 “마호메트는 알라의 사자(라수르)이니라”가 추가되었다.
이 성구(聖句:카리마)를 외는 일은 신도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되어 있다.
알라의 가르침을 모은 《코란》에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믿음이란, 그대들의 얼굴을 동으로 또는 서로 돌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알라와, 최후의 날(최후 심판의 날)과, 천사들과, 여러 경전(經典)과,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을 믿는 것을 ‘이만’이라고 한다. 또 오로지 알라만을 믿고 그 외에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예배·희사(喜捨)·재계(齋戒) 등의 근행(勤行)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만이 알라에 귀의하는 길인데, 이것을 ‘이슬람’이라고 칭한다. ‘이만’을 지닌 사람을 ‘무민’, 이슬람에 입교한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므로, 이것들 모두가 이슬람교 신자의 호칭이다.
⑶ 이슬람 신앙의 요소:이슬람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의 셋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지(知)’인데, 이것은 알라의 계시를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언(言)’인데, 마음으로 알고 또한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일이다. 셋째는 ‘행(行)’인데, 이슬람교도로서의 의무(즉 5주 등)를 열심히 실행하는 일이다.
⑷ 오주(五柱):무슬림에게는 실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것을 오주(아르칸 알이슬람:Pillars of Islam)라 하며, 이들 의무를 다함으로써 알라에게 봉사하는 일을 ‘이바다트(奉化 또는 勤行)’라고 한다. 《코란》에서는 희사와 단식(斷食)을 중요한 봉사로 들고 있으나, 후세에 이르러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① 증언 또는 고백(샤하다):“나는 알라 이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또 나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사자임을 증명합니다”를 입으로 왼다. 신도는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증언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
② 예배(살라트):일정한 시각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행하는 예배를 말하며, 개인적으로 수시로 행하는 기도는 ‘두아’라고 부른다. 예배는 하루에 다섯 번을 일출·정오·하오·일몰·심야에 하며, 특히 금요일 정오에는 모스크에서 집단예배를 행한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하고 행한다.
③ 희사(자카트) 또는 천과(天課):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며, 비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기반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불가결한 무슬림의 의무중의 하나이다.
④ 단식(샤움):성년인 무슬림은 매년 라마단 월간(月間:제9월) 주간(晝間)에 음식·흡연·향료·성교를 금하고, 과격한 말을 삼가며 가능한 한 《코란》을 독송한다. 단 음식은 흰실과 검은실의 구별이 안 될 만큼 어두워진 야간에는 허용된다. 라마단 월이 끝난 다음 새 달이 하늘에 떠오르면 단식완료의 축제가 시작되는데, 화려한 의상을 입은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서로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⑤ 순례(하주):모든 무슬림은 매년 하주의 달(이슬람력 제12월)에 카바 신전 부근 또는 메카 북동쪽 교외에서 열리는 대제(大祭)에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참가할 의무가 있다. 능력이 없는 자는 하주를 못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해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현재도 매년 약 20만 명에 달하는 신도가 하주에 참가하고 있다. 메카 다음가는 성지는 메디나에 있는 마호메트 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예루살렘의 여러 성적(聖蹟) 등이 있으며, 또 시아파(派)의 무슬림은 알리의 묘(廟)가 있는 나자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의 묘가 있는 카르발라, 이란 동부의 마슈하드 등을 순례하는 사람이 많다.
⑸ 교도의 일상생활:이슬람 세계는 많은 이민족을 포함하고 있어 그들은 각각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사회의 요소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무슬림은 하나의 형으로 통일되어 공통의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샤리아(이슬람법)로써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며,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 Hadith》(마호메트와 그의 추종자들의 전설에 관한 서적에 사용되는 명칭)에 입각하여 제정된 이슬람법이다.
무릇, 무슬림된 자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 샤리아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된다. 인간의 행위는 5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반드시 행해야 하며 이것을 하면 보상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② 가상(可賞)할 행위로, 이것을 행하면 보상받으나 행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는 것,
③ 허용된 행위로, 이것은 행하여도 보상도 없고 벌도 받지 않는 것,
④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것은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행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⑤ 금지된 것으로 이것을 행하면 알라의 벌을 받는 것이다(하람, Haram:이슬람법 용어).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거나 음주하거나 하는 일은 하람 ⑤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람에 대하여는 시대와 지방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약간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중세 이래 모스크는 교도의 생활중심이 되어 왔으나 11세기 투르크가 각지에서 지배권을 장악한 뒤부터는 오로지 예배장소로만 되고, 그 밖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샤리아에 따라 규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이슬람교도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이단파와 수피즘】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란》이지만 마호메트가 죽은 뒤에는 그것만으로는 교의상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그러한 때에는 ‘수나(마호메트의 언행)’로써 보완되었다.
그리고 이 수나를 중요시하여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수니파(派)라고 하여 이것이 이슬람교의 정통파로 지목되는데, 이슬람교도의 대부분이 수니파에 속한다. 아라비아의 원시 이슬람은 다른 여러 민족을 정복함에 따라 많은 종교와 사상에 부딪쳐,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몇 개의 이단적 유파(流派)가 생겨났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뱃사람이나 장사꾼을 그 주축으로 하는 하리지파(派)가 그 최초의 것인데, 7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오만·동아프리카·북아프리카 등지에 약간 잔존할 뿐이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혈통은 딸 파티마와 제4대 칼리프인 그의 조카 알리와의 사이에 태어난 하산과 후세인의 두 아들 계통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 특히 후세인의 계열을 교주로 추대하는 시아파(派)는 후에 이란의 종교사상을 받아들여 최초의 이단적 종파가 되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 교리는 70개로 분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고 하는데, 확실히 시아파는 많은 지파(支派)로 분열되어 극단파를 낳았는데, 개중에는 이미 이슬람교로 간주할 수 없게 된 것까지도 있다. 이같이 이단 종파는 상당수가 있으나, 신도수는 전체의 10 %에도 못 미친다.
이슬람의 신비주의라고 일컫는 수피즘(또는 수피파)은 원래 원시 이슬람 사회 안에서 금욕·고행을 주의로 삼는 일파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그리스 사상과 유대교·그리스도교·불교 등의 신비주의까지 받아들여 사상계의 일대조류로 발전하였다. 이 수피즘은 이슬람 신앙의 형식주의, 행위의 표면만을 보고 사람을 심판하는 이슬람법에 대한 반동에서 발전한 것으로, 이슬람교가 세계적 대종교로 발전한 것은 실은 이 수피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반면 이슬람 사상 속에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배격하려는 자도 있다.
【발 전】 ⑴ 이슬람권의 확대:마호메트의 사후, 교단은 신도의 장로 중에서 교통(敎統)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출하였다. 그 후 아라비아반도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633~664년 시리아·이라크·북부 메소포타미아·아르메니아·이란·이집트 등을 정복하고 여러 곳에 기지도시(基地都市)를 건설하였다.
그 후에도 정복사업은 계속되어 우마이야왕조 시대에는 서쪽은 북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까지, 다시 711년부터는 이베리아(에스파냐) 반도에 침입하였고, 동쪽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그 지배력이 미쳤다.
피레네산맥을 넘어 프랑스의 중추부까지 진출한 군은 732년 푸아티에 북방의 싸움에서 패퇴하였으나, 동방에서는 751년 여름 탈라스강(江)의 싸움에서 당군(唐軍)을 대파하고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아바스 왕조 초기 100년간은 칼리프 정권의 전성기였는데, 그 후 이베리아는 우마이야가(家) 일파에 의하여 독립하고, 이어서 모로코·튀니스·중앙아시아·이란 동부·이집트 등에도 독립정권이 출현하여 칼리프의 직할지는 점차 축소되었다.
10세기에 들어서자 921년 이후 볼가강 중류의 불가르족(族)이, 이어서 960년 이래 톈산남북로[天山南北路]의 투르크족(族)이 다같이 대량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아랍족, 이어서 이란인(人)이 중심이었던 이슬람 세계는 이 무렵부터 투르크의 패권 밑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생겨, 10세기 말부터는 투르크계 가즈니왕조의 마호무드왕은 자주 인도에 침입하여 이 지방의 이슬람화가 확고한 기반에 놓였다.
한편, 동아프리카에는 740년 무렵부터 이슬람교가 퍼지기 시작하여 1010년경에는 사하라 사막을 넘어 나이저 강변의 서(西) 수단 지방에 있는 흑인 왕국에까지 이슬람의 세력이 미쳤다. 1071년 아르메니아의 만지케르트 싸움에서 셀주크 투르크군은 비잔틴군을 격파하였다. 이 때부터 서아시아의 이슬람화·투르크화가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11세기 말~13세기 말의 거의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운동이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그리스도교도의 역정복(逆征服)이 진행되어 1493년에는 무어인(人)의 최후 거점인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마침내 이슬람은 북아프리카로 후퇴하였다. 이와는 달리 셀주크왕조와 교체된 오스만왕조는 발칸반도로 진출하여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공략, 비잔틴 제국(帝國)을 멸망시켰다. 또 인도에 세력을 부식한 이슬람교도는 이곳을 기지로 하여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방면에 선교를 하여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는 15~16세기에 광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⑵ 분포 현황:현재의 이슬람 교도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계 인구의 약 25 %인 12억 내외로 알려져 있다.
지역적으로는 북아프리카·아라비아반도와 이란에 이르는 이른바 중동지역과, 동부 러시아, 투르크·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서부·중국·인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타 한국·일본 등 세계 곳곳으로 선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도 오랜 이슬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백 만의 무슬림들이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서의 이슬람 문화·역사·종교학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도 오래되었고 수준도 높다.
【한국의 이슬람교】 불교와 그리스도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에게 생소한 이슬람교가 그 두꺼운 벽을 뚫고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55년이다. 이슬람교의 전파는 1955년 9월, 6·25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터키 부대의 압둘 라흐만 종군 이맘(성직자를 가리킴)과 주베르코취 종군 이맘의 지도와 협조 아래 김진규(金振圭)와 윤두영(尹斗榮)이 선교를 시작하였다.
한국 이슬람교 협회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 김진규, 부회장 겸 사무국장 윤두영과 신도 70여 명으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시작되었다. 초창기 10여 년 간에 선교·운영의 난관을 극복하고 65년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로 재발족, 67년 3월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로 인가되어 신도 7,500명의 교세를 갖게 되었다.
76년 5월 현재의 용산구 한남동에 중앙성원(中央聖院)을 건립하고(사우디아라비아 기타 6개국의 원조로), 80년 항도 부산에 제2성원, 81년 경기 광주에 제3성원, 86년에는 안양시에 제4성원과 전주시에 제5성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해외교포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인도네시아에 지회가 설립되고 국내의 신도수 약 3만 4000명의 교세를 가지게 되었다.
80년 5월 대통령 최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칼리드 국왕과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한국 이슬람대학 설립 공사비 일체의 제공을 확약받았으며, 경기 용인에 13만 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한국의 이슬람교는 70년대의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두드러지게 교세 확장을 보였는데, 매년 중동 각지에서 무슬림이 되어 귀국한 1,700여 명의 기능근로자 신도들을 핵으로 삼아 신도 배가운동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슬람교는 한국인의 유교적 전통이나, 현대의 남녀동등 사상까지의 차이점 일부일처주의의 헌법조항에 배치되는 일부다처주의 등을 비롯하여 예배의식의 용어 및 교리의 토착화 등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이슬람교 경전 코란(Koran/Quran)
이슬람교의 경전(經典).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619년경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부터 632년 죽을 때까지의 계시·설교를 집대성한 것이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40세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근교의 히라산(山) 동굴에서 천사(天使)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코란》이란 아랍어로 ‘읽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계시받은 마호메트의 말은 초기의 사도(使徒)들에 의해 기억되어 낙타의 골편(骨片)이나 야자의 엽피(葉皮), 암석의 파편 등에 불완전한 문자로 기록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승이 다양해져 그의 집성·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코란》의 결집(結集)이 이루어졌는데, 초대 칼리프 아부 바크루가 시도하여 본격적인 결집은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이 646년에 완성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란》은 당시 정리된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코란의 구성】 《코란》의 용어는 아랍어의 메카 방언이었으나 이것이 후에 고전 아랍어로 널리 쓰이게 되어 현행 아랍어 문어체의 기초가 되었다. 문체는 ‘사주아’라는 일종의 운(韻)을 단 산문체로 되어 있어 독송할 때 그 리듬감이 매력을 느끼게 한다. 현행 《코란》은 6,342아야[句節]와 114수라[章]로 되어 있으며, 각 수라에는 ‘암소’, ‘이므란 일가(一家)’, ‘여자’ 등과 같이 그 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제가 붙어 있다.
제1수라의 개경장(開經章)은 7아야로 된 짧은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주기도문(主祈禱文)’에 해당하며, 이슬람교도는 자주 이것을 독송해야 한다. 다른 수라는 대개 아야의 수가 많은 것에서 적은 것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서 최종 장에 이르러서는 아야의 수가 아주 적어진다. 예를 들면, 제2수라는 286아야, 제3수라는 200아야인데, 제113수라는 5아야, 제114수라는 6아야로 되어 있다. 모든 수라에는 ‘메디나 계시(啓示)’ 또는 ‘메카 계시’라는 표시가 있는데, 메카 시대의 계시는 극히 신앙적인 짧은 것이기 때문에 현행 《코란》에서는 대개 후반에 집성되어 있고, 후대의 메디나 계시는 대부분 전반에 편입되어 있다.
【코란과 주해서】 《코란》에는 아랍의 고속(古俗)과 유대교·그리스도교의 전승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또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역사적 사건에 관한 부분도 적지 않으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코란》에 주해(탑시르)를 첨기(添記)할 필요성이 생겨 그것이 이슬람 신학자들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었다.
※ 상기의 내용은 두산세계대백과 사전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